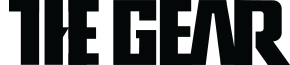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마우스의 필요성을 없앴던 기기들이 시대의 주인공이 되어 왔다.

최초의 마우스는 목침과 피자칼을 합친 것처럼 생겼다. 이름은 엥겔바트 x-y 입력기
1990년대 이후, 윈도우가 지배하던 몇십 년 동안이나 MS 진영은 UI 발전에 게을렀다. 마우스는 볼마우스→광학 마우스→동글 포함 무선 마우스→블루투스 마우스로 ‘과학적으로만’ 발달했다. 물론 G 시리즈, 인옵 마우스 등 명기는 편의성으로 사랑을 받았지만 UI 자체가 근본적으로 개선된 건 아니다.

명기로 추앙받는 인텔리마우스 옵티컬, 현재도 많이 쓴다
반면 애플은 항상 진보적인 UI를 들고나오곤 했다. 애플은 버튼으로도 충분했던 아이팟에 터치 휠 UI를 장착하며 마우스 이후에 또 다른 UI 혁명을 일으켰다. 그러다가 입력도구 면에서 거의 흠이 없는 아이폰이 등장했다. 이후 UI는 같지만 UX는 다른 아이패드가 등장했고, 스마트폰과 태블릿의 영향으로 전 세계 랩톱 출하량이 차츰 감소한다. 생산성이 아닌 놀이를 위해서는 모바일 기기로도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놀이 앱은 소셜 미디어, 메신저, 웹 브라우저다.
다만 아이패드는 생산성 기기로는 인정받지 못했는데, 사용자들이 유사 PC 기기에 바라는 두 기능, ‘워드프로세서’와 ‘인터넷’ 중 터치스크린으로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는 게 무리였다. 블루투스 키보드를 사용할 수는 있다. 그런데 키보드-마우스는 영혼의 짝이지만 키보드-터치스크린은 그렇지 않다. 키보드 옆에서부터 터치하기까지 거리가 멀고 신체적으로 무리가 온다. 터치를 한 후엔 꼭 키보드가 있는 자리로 돌아와야 하는데 이 움직임이 어색하다. UX(User eXperience), 즉, 사용자 경험상 좋은 경험이 아니었다.
사실 애플의 고민은 오히려 사소했다. 그 동안 MS와 그의 식솔(하드웨어 제조사)들은 정말 아무 것도 하지 못했다. 아톰 프로세서와 넷북이 등장했지만 작은 스크린을 고려하지 않은 UI와 처절한 속도로 사용자를 주화입마에 빠뜨렸다. 당시 MS와 인텔, 제조사들은 맥북 에어와 똑같이 생긴 노트북이나 만들며 ‘울트라씬’이라 명명하며 맥북 에어 급의 가격을 붙였다가 소비자들에게 혼쭐이 났다.
윈도우는 대응책으로 터치스크린 기반의 윈도우 8을 내놓았으나, 사람들은 시작 버튼이 없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랩톱 판매량 하락의 직격타를 얻어맞은 PC 제조사들은 윈도우8을 이용해 급히 태블릿 PC들을 만들었지만 망했다. 이 시기(넷북~윈도우 8.1 출시 전)를 MS의 눈물고개라고 칭하고 싶다. 다행이었던 건 그동안 터치스크린에 대한 노하우가 쌓여 서피스를 시작으로 모바일 기기에 대한 감을 잡기 시작했다. 2-in-1으로 불리우는 서피스 시리즈는 꾸준히 발달했고, 맥북과 아이패드를 모두 견제할 기기인 서피스북으로 재탄생했다. 집 안을 놀이터로 바꿀 AR 홀로렌즈도 선보였다. 윈도우폰이 남았지만 그건 신도 살릴 수 없다.
이 과정에서 사라진 것은 마우스다. 애플의 모바일 제품은 원래 커서를 지원하지 않았다. 즉, 마우스가 필요 없다. 맥의 트랙패드는 마우스가 필요 없을 만큼 훌륭하다. MS 역시 윈도우 10부터 좋은 터치패드를 쓸 수 있게 됐다. 그전 윈도우는 좋은 터치패드를 활용할 수 없도록 설계돼 있었고(두 손가락으로 확대하면 익스플로러가 우두둑거리며 늘어났다. 세 손가락부터는 하드웨어만 인지하고 OS는 아무것도 할 줄 몰랐다), 그래서 PC 제조사들은 아예 좋은 터치패드를 탑재하지 않았다.

서피스북은 생산성 태블릿, 랩톱, 모니터가 있다면 데스크톱 모두로 쓸 수 있는 무서운 기기다.
마우스가 점차 줄어드는 건 PC의 휴대성이 그만큼 강조되는 시대기 때문이다. 데스크톱과는 달리 2-in-1 PC의 모니터는 주로 단독으로 쓸 수 있는 태블릿이다. 태블릿은 보통 10인치 이하로 작아서 화면과 사용자 간 거리가 데스크톱보다 짧다. 정확성 문제만 없다면 탁자에 팔꿈치를 올려놓고도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다. 터치 후 손이 키보드 앞으로 돌아오는 무의미한 시간(Homing Time)이 덜 무의미해지는 것이다.
마우스를 휴대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 다만 무선 마우스에는 필연적으로 블루투스의 안정성과 배터리가 필요하다. 만약 마우스 없이 모든 입력이 가능하다면 안 쓰면 되는 물건으로 전락한다. 아이패드 프로와 서피스는 모두 스타일러스를 제공하고, 그 품질 또한 뛰어나다. 서피스는 번들 키보드에 터치패드까지 달려있다. 즉, 키보드-마우스의 안정적인 결혼관계는 키보드-터치패드-스크린의 자유로운 쓰리썸으로 변화할 수 있다.

마우스를 대부분 대체 가능한 아이패드 프로와 애플 펜슬, 충전 걱정도 없다.
스마트폰의 경우 정밀성을 담보할 도구가 없었으나, 애플이 3D 터치를 적용하며 ‘마우스 오른쪽 클릭’과 비슷한 효과를 제공한다. 양쪽 클릭, 휠 스크롤이 주 입력 방식인 마우스는 이제 손가락(터치, 픽, 팝, 스크룰)으로도 대부분 대체 가능하게 된 것이다.
물론 마우스의 안정감은 대단한 것이어서, 올인원 PC나 데스크톱 곁에는 오래도록 남을 것이다. 전문직이나 게이머들에게도 주효하다. 다만 그래픽 디자이너에게는 오래전부터 훌륭한 스타일러스가 존재했으며, 게임의 경우 VR의 등장으로 인해 마우스의 입지가 줄어들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VR은 마우스가 아닌 지방 흡입할 때 쓰는 모양의 작대기를 컨트롤러로 사용한다. 혹은 마우스보다는 인지가 쉬운 리모컨이나 게임패드 등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와콤의 인튜어스 프로는 스타일러스, 멀티터치(팜 인젝션 가능), 휠 UI 등 키보드를 제외한 대부분의 UI를 구현했다.
'모바일 네이티브'의 성장 역시 마우스의 존재에 위협이다. 처음 만져본 기기가 스마트폰 혹은 태블릿인 세대를 모바일 네이티브라고 한다. 현재 초등학교 고학년쯤 됐다. 이들이 전문직으로 성장하지 않는다면 굳이 마우스 사용법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우스는 상당시간 여전히 우리 자리를 지킬 것이다. 다만 당신은 앞으로 기기별로 여러 개의 마우스를 보유할 필요는 없어진다. 데스크톱용 가벼운 제품 혹은 고가 제품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긴다.
글 : 이종철, 편집 : 김정철 - 이 글은 컬럼니스트의 의견으로 더기어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품 리뷰를 원하는 분은 sun@thegear.kr 로 문의주세요.
저작권자 © 더기어(TheGEA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리뷰전문 유튜브 채널 더기어TV]
저작권자 © 더기어(TheGEA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ABOUT AUTHOR